본격 학원 명랑 미스터리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지음,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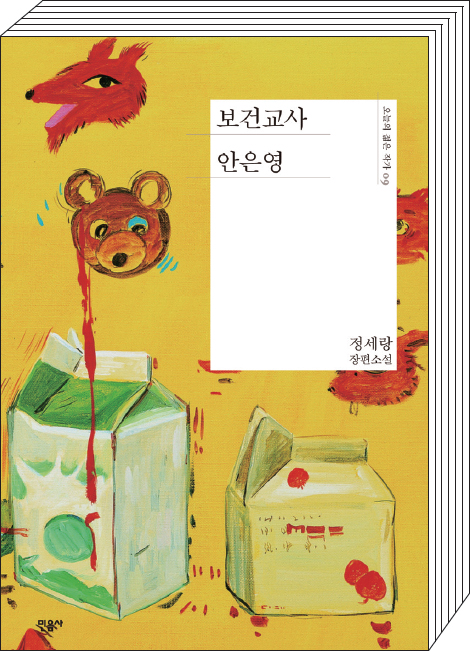
여기 한 여자를 소개한다. 비비탄 총과 무지개 색 늘어나는 깔때 기형 장난감 칼을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는 여자. 통굽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급할 때는 스타킹이 찢어지도록 뛰어다니는 여자.
사립 M고 보건교사 안은영이다.
‘사립 M고’라는 배경은, 소리내어 불러보면 금세 감이 온다.
이건 순문학의 배경은 아니다. 당연히 장르물이다. 출판사에선
‘본격 학원 명랑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세랑 작가의 새 장편 소설이다. 그는 순문학과 장르물을
오가면서 활동해온 작가다. 이번엔 장르소설이다. 그것도 오로지 ‘재미지기만’ 한 소설이다. 글 첫머리에서 소개한 안은영의 모습에서 짐작되듯 이 소설은 무척 유쾌하다.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로 귀신과 싸우는 보건교사라니, 다소 잡다해 보이는 설정이지만 읽는 사람의 재미를 돋우는 덴 맞춤하다.
살짝 알렸듯 은영은 투잡이다. 보건교사 겸 퇴마사. 이 책은
은영의 퇴마 활약상이다. 가령 첫 장(章)은 남학생 승권의 목에
꽂힌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은영이 빼내면서 시작된다.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음을 직감한 은영이 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지하실에 이른다. 그 자리에 한문선생님이자 학교 설립자의
후손인 인표도 함께한다. 시멘트로 덮이지 않은 흙바닥 한가운데 ‘압지석’이라고 새겨진 돌을 보고, 무감한 인표가 이 돌을 뒤집어버린다. 솟아나와버린 건 귀신. 학생들을 넙죽넙죽 쓰러뜨리는 귀신을 때려잡는 건 은영의 몫이다.
휙휙 넘어가는 만화책을 보는 것 같다. 지하실에 내려간 은
영 앞에 갑자기 인표가 나타난다든지, 이유 없이 그냥 돌을 뒤집는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우연의 연속도 본격 문학의 공식은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재미나기 위한 것이다. 사내 녀석 둘이 붙어 다니면서 괴상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통에 학교에선
때때로 작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 기운이 사내놈들의 겨드랑이
털에서 나온다는 것, 기운을 막으려면 겨드랑이 털을 묶어서 매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하고도 웃음 비죽비죽 나오는
설정이지만 소설의 은영과 인표는 사뭇 진지하고 비장하다.
배경이 고교인지라 아이들의 풋사랑도 있고 교사에 대한 짝
사랑도 있다.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비판도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색을 하고 대하진 않았다. 당연하지만, 어색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진다. 심각하게 쓰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와 닿는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오로지 쾌감을
위해 썼고,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의 실패일 것”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물론 성공이다.
짜릿하고 통쾌하게 직설적이게 詩하기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김민정 지음,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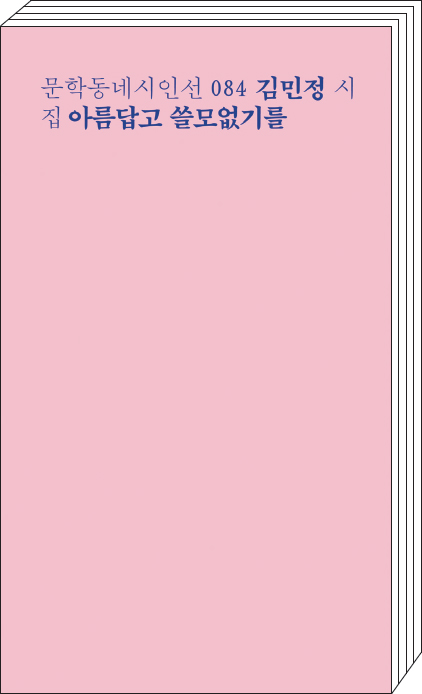
시인들을 만날 때 나는 경건해진다. 그들은 세상의 부정함과 속됨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살아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속됨에 언어로 맞서면서 순결을 지키는 것뿐이다. 시인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자를 떠올리게 하는 순결함이 있다.
김민정 씨의 시집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을 읽었다. 그는
시인이자 시집을 만드는 편집자다. 시인 하면 떠오르는 조용하고 숫기 없는 전형과 달리, 그는 무척 활달하고 화려해 보인다.
외모처럼 언어도 감각적이어서 첫 시집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에선 분방한 감각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은 발랄한 그가 40대가 돼서 낸 시집이다. 물론 40대에도 그는 여전히 발랄하다. 그의 시도 그렇다. 가령 시 <수단과 방법으로 배워갑니다>는 ‘아빠 김연회의 메일’과 ‘시인 장철문의 카톡’ ‘화가 차규선의 문자’ ‘편집자 황예인과의 채팅’으로 이뤄진 시다. 아빠 김연회는 “밴댕이는 연탄불에
구워먹는 그 맛인데/ 이제는 미리 구워서 나온다”고, 시인 장철문은 “너를 바꾸는 게 쉽냐/ 남을 바꾸는 게 쉽냐”고, 편집자 황예인은 “언니 시집 빨리 묶어요 (…) 시집 만들어보고 싶음……”이라고 적는다. 메일, 카톡, 문자, 채팅… 현대의 소통 수단은 공
교롭게도 모두 ‘문자’다. 문자로 오가는 얘기들은 얼핏 수다인 것
같아도 정이 있고 감각이 있다. 이런 게 시가 아니고 뭘까, 현대의 문자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시인은 이렇게 전한다.
이런 시는 또 어떤가. “물은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얼굴을
몰라서/ 해도 해도 영 개운해질 수가 없는 게 세수라며/ 돌 위에
세숫비누를 올려둔 건 너였다/ 김을 담은 플라스틱 밀폐용기 뚜껑 위에/ 김이 나갈까 돌을 얹어둔 건 나였다/ 돌의 쓰임을 두고
머리를 맞대던 순간이/ 그러고 보면 사랑이었다”(<아름답고 쓸모없기를>에서) 주워온 돌이란 게 무슨 쓰임이 있는지. 세숫비누를 올려두기도 하고, 김이 나갈까 뚜껑 위에 얹어두기도 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돌이란
쓸모없는 걸까. 시인은 ‘그 쓰임을 두고 머리를 맞대던 순간’을
간직한 돌에 사랑의 기억이 깃들어 있음을 간파한다. 그때의 돌은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게 된다.
“시는 내가 못 쓸 때 시 같았다”고 시인은 겸허하게 말하지만, 나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이 부끄러운 세상을 무감하게 살았던 시간이 부끄러워졌다. 그걸 조용히 일러준 시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 글 김지영
-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민음사, 문학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