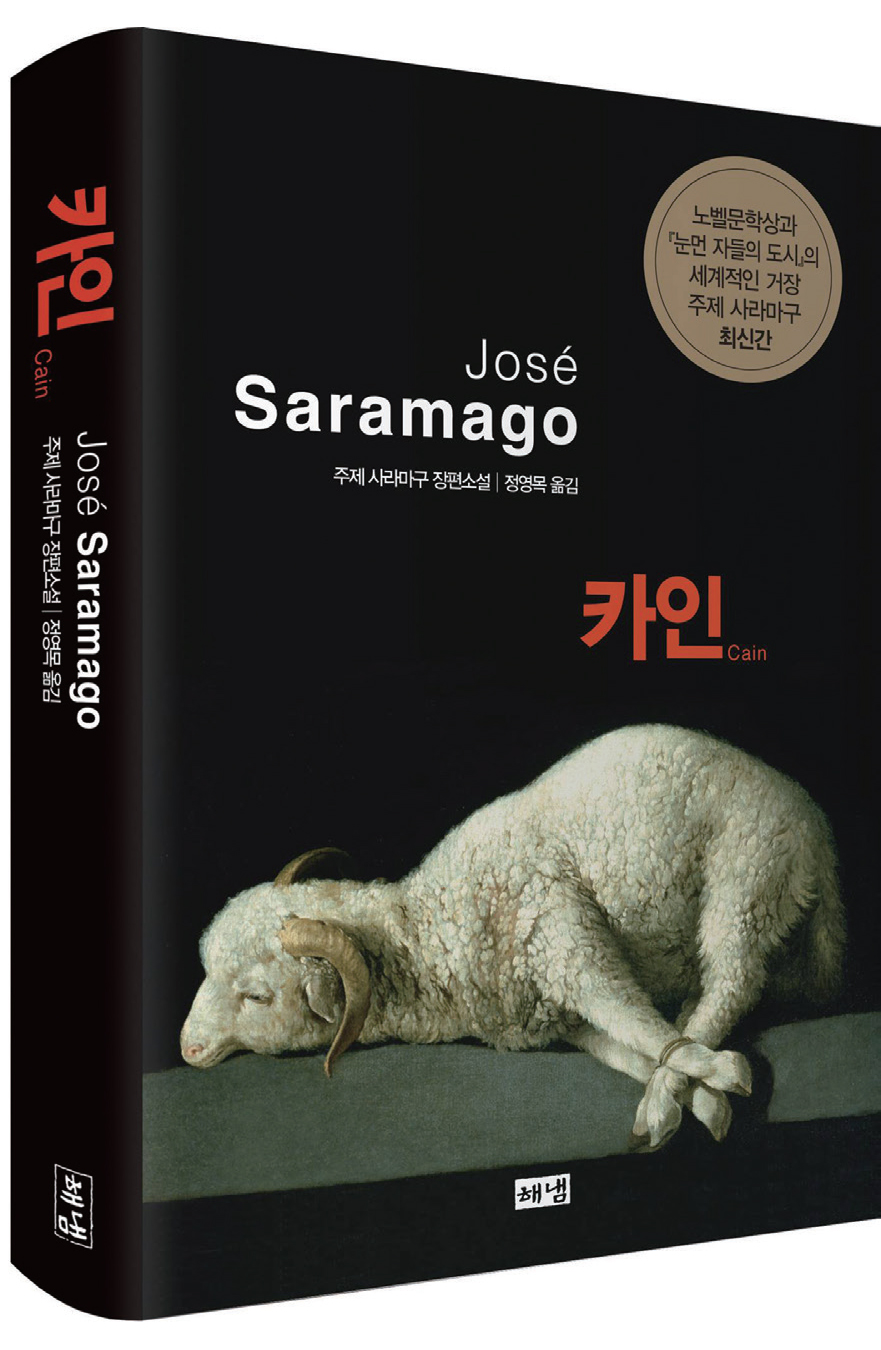
두 대가의 만년 걸작을 만나다
어떤 책이든 비슷하겠지만 성격상 다른 종류의 책에 비해 재미있을 공산이 큰 소설책마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재미가 덜한 경우가 많다. 일간지 문학담당 기자는 그런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존재다. 일종의 직업병일 텐데, 빠듯한 시간 내에 후다닥 읽어치우고선 서둘러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아무런 의무에도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느긋하게, 소설이 품고 있는 자유로움과 개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읽어나가는 재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소설은 정말 괜찮은 소설임에 틀림없다고.
그런 책 두 권을 소개하려 한다. 한 권은 지난해 말 출간돼 필자가 신문 리뷰로도 소개한 주제 사라마구의 장편 <카인>(해냄), 또 한 권은 미국 작가 필립 로스의 2008년 장편소설 <울분>(문학동네)이다. 물론 이런 선택도 다분히 자의적인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장르 불문, 예술 작품이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감상자의 개별적인 반응은 보편적인 ‘일반 법칙’(그런 게 있다면)을 추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다. 참고로 새해 들어 50대에 진입한 필자는 판타지보다는 리얼리티, 무작정 가벼움보다는 적당한 진지함, 독자를 빨아들일 듯한 스토리텔링도 좋아하지만 설득력 있는 인생 통찰이 적절하게 뿌려진 작품을 더 좋아한다.
두 책은 여러모로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우선 작가의 체급이 비슷하다. 2010년 세상을 뜬 포르투갈의 문호 사라마구는 199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 목록은 시대의 고전에 값한다. 2012년 돌연 절필을 선언한 필립 로스는 ‘아직 받지 못했을 뿐’, 해마다 노벨상 단골 후보로 거론된다. 평소 병렬식 배열을 경계하는 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 두 작품 모두 두 대가의 만년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인>은 사라마구가 죽기 한 해 전인 2009년에 세상에 내놓은 말 그대로 마지막 작품이다. <울분>은 1933년생인 필립 로스가 일흔여섯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런 걸보면 인간의 창조력 곡선은 나이 들며 쇠퇴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두 사람이 예외적인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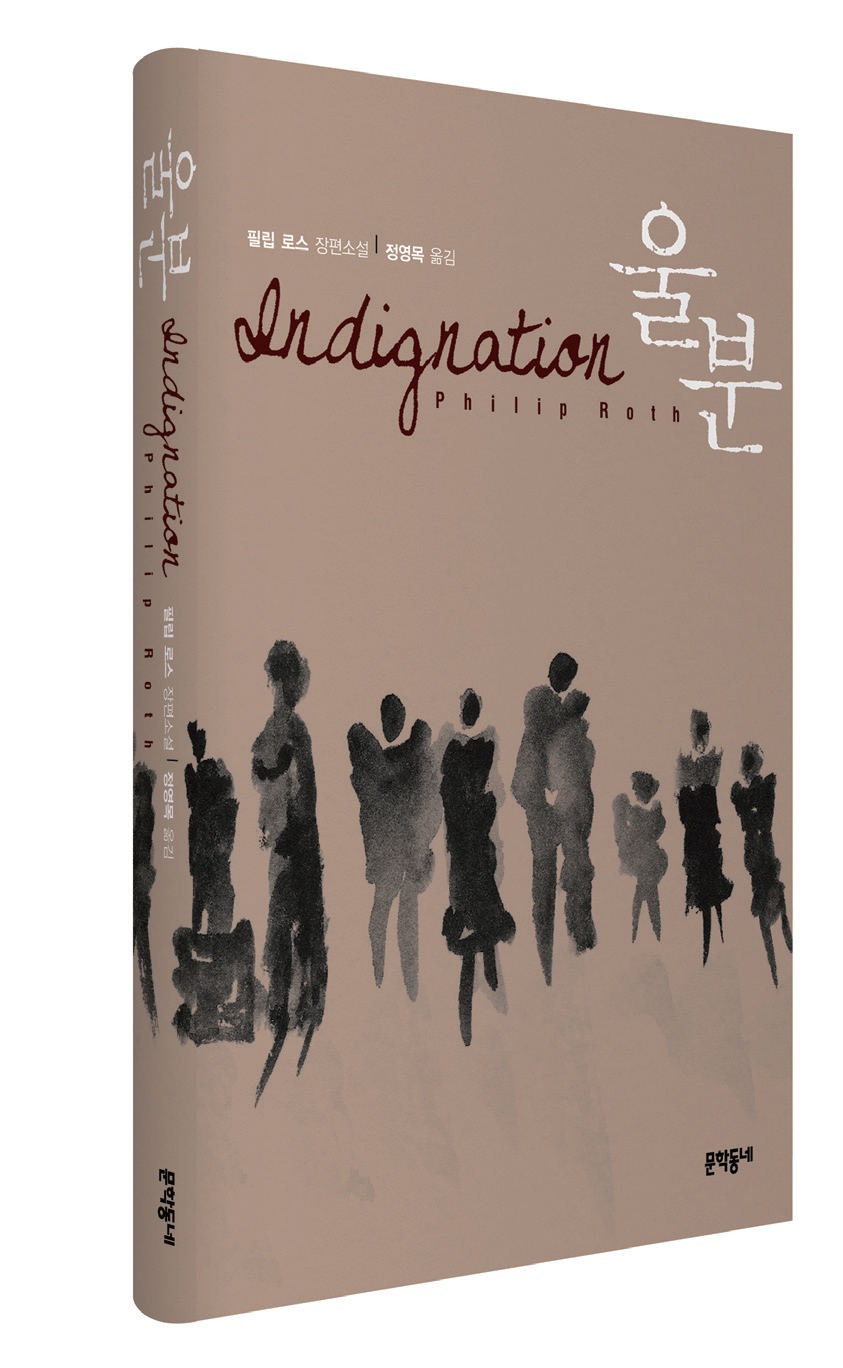
인간과 종교, 혹은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성찰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정도 차는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종교 문제가 소설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카인>은 성경이 전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주인공인 작품이다. 한데 소설은 신앙심 넘치는 종교소설이 아니다. 되바라진 카인은 대담하게도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대든다. 신의 섭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의 사명인 것처럼 보인다. 핵심은 전지전능한 존재인 하나님이 어째서 카인 자신의 범죄를 예측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영원히 낙인찍히도록 내버려뒀느냐는 것이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흠집이 생긴다. 신앙인들에게는 도발적이고 불경스러운 소설, 반(反) 종교소설이다.
<울분>은 종교 혹은 반종교소설은 아니다. 영어 원제 ‘Indignation’은 ‘잘못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생기는 분노’라는 뜻이다. 소설 주인공 마커스 메스너가 울분을 느끼는 주요 대상중 하나가 소설의 시대 배경인 1950년대 미국 종교재단 대학의 억압적인 분위기, 피 끓는 당시 젊은이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딱딱한 교내 규칙 같은 것들이다. 결국 맹장의 부속 장기인충수(蟲垂) 질환이 원인으로 밝혀지지만 메스너는 고지식한 신앙인인 대학 학장과 면담 중에 구역질을 느낀 나머지 학장실 바닥과 벽에 질펀하게 토해버린다. 메스너는 끝내 종교에 충실하지 못한 게 표면적인 이유가 돼 존재의 결정적 운명이 결정되는 처지에 빠진다. 인간을 위한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 자신에게 불행이 돌아오는 소설 속 설정은 작품이 품고 있는 최대의 아이러니다.
두 작품은 성적인 표현에 거침없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우선 <울분>. 필립 로스는 1950년대 미국 대학가의 성 풍속도를 ‘파란 불알’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한다. 남녀 성 접촉에서 오르가슴으로 방출할 만한 여건이 안 돼 흥분 시간만 길어질 경우 건장한 청년들이 고환 주위에서 느끼는 통증이 파란 불알이다. 로스는 주말이면 와인스버그 대학 일대에 그런 고통을 겪은 학생이 수십 명이었다고 능청 떤다.
사라마구의 ‘파격’은 더하다. 카인은 아내 릴리스(영어 스펠링이 ‘release’라면 하필 ‘방출한다’는 뜻이다)와 허구한 날 뜨거운 밤을 보낸다. 그 장면 묘사가 거의 ‘포르노’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데다 화끈하기까지한 소설 두 편.
- 글 신준봉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 문화연구 MA.
- 사진 제공 해냄출판사, 문학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