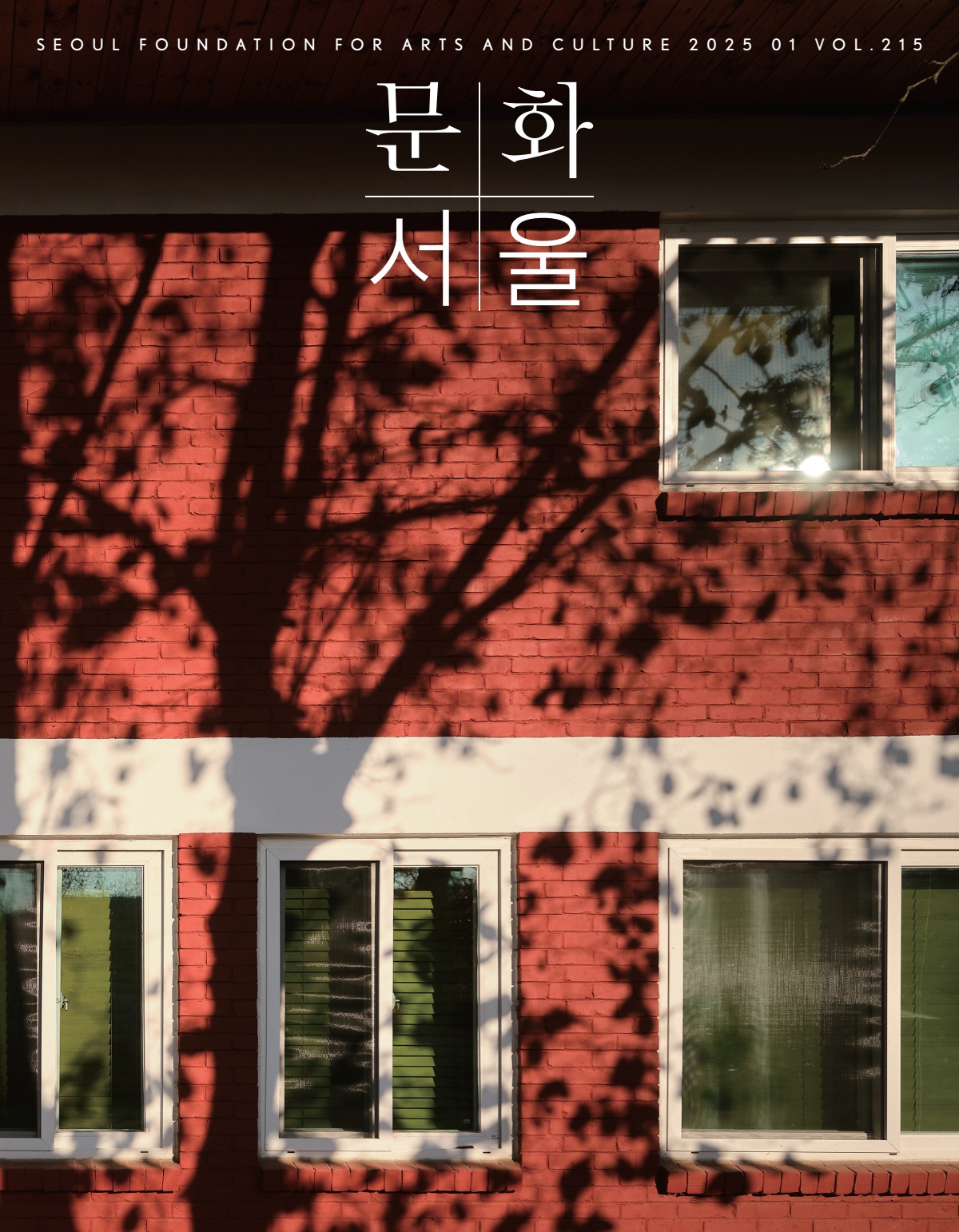음악,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
차로 서너 시간을 꼬박 달려 통영의 관문인
원문고개에 도착하는 순간, 벅차오를
정도로 근사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와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 굽이진 길 너머로 보이는
야트막한 건물들. 봄볕은 또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따사로운 빛에 흔들리는 윤슬과
야자수잎을 보고 있으면 왜 예술가들이
이 도시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것만 같다.
매년 봄을 맞이하는 장소로 통영을 택한 건
순전히 음악 때문이다. 누군가의 봄은
여의도나 남산 벚꽃길에 있겠지만, 내 봄은
원문고개를 지나 통영국제음악당까지 가는
길 위에 있다. 이 머나먼 남쪽까지 찾아와
봄을 보내는 건 이때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어서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음악, 그중에서도 현대음악의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들, 때론
현대음악의 최신 현대음악이 있어서다.
‘현대음악의 최신 현대음악’이라는
웃기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부연해야겠다. 이 말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서양음악사 속 현대음악의
시작점에 놓인 쇤베르크나 그의 제자
같은 작곡가가 아니라 아직 음악사 책에
이름을 적어넣기 이른, 지금 당장 활발히
활동하는 요즘 작곡가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주 작곡가였던 온드르제이
아다메크Ondřej Adamek는 그 낯선
이름만큼이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체코 출신의 40대 작곡가로, 움직임과
소리, 낯선 이야기와 노래 사이에서
참신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2023년
<북 오브 워터The Book of Water>를 선보인
작곡가 미셸 판 데르 아Michel van der Aa는
50대 네덜란드 작곡가로, 미디어와 극을
섬세하게 다루는 작품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아니라면 베니스 비엔날레 정도는 가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이런 작곡가들의
최근 작품을 국내에서 만나는 건 정말
만나기 드문 행운이다.
2023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공연한 <북 오브 워터> ⓒTIMF
올해 음악제에서 만날 수 있는 현대음악은
최신보다는 조금 더 고전 쪽에 가깝다.
올해의 상주 작곡가 한스 아브라함센Hans
Abrahamsen은 70대 덴마크 작곡가로,
‘슈니Schnee’와 ‘렛미텔유Let Me Tell You’ 등
손꼽히는 대표작으로 이미 널리 이름을
떨쳤다. 시간 감각을 절묘하게 다루는
그의 곡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가도, 흐르는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환영처럼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번
음악제에서는 그가 작곡한 실내악곡·
협주곡· 오케스트라곡과 편곡 작품을
고루 만날 수 있지만, 그중 제일 기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레프트, 얼론Left, alone’이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일찍이
모리스 라벨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한 손을 잃은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쓴 편성이다. 한스 아브라함센이 같은
형식으로 곡을 쓴 건, 그가 태생적으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피아노 음악에 관해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한 이런 조건이 그의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몹시
기대되지만, 그 연주를 바로 선우예권이
맡는다는 사실이 한층 더 큰 기대를
품게 한다.
이번 음악제에서 두 차례나 공연될
제라르 그리세Gerard Grisey의 ‘시간의
소용돌이Vortex Temporum’도 놓칠 수
없는 현대음악의 고전이다. 대학
시절, 작곡과 선배가 이 곡은 그야말로
“우주대명곡”이라며, 실연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당부를 잊지 않은 채 나는 8년 전
TIMF앙상블의 연주로 이 곡을 들었고,
그것이 정말로 세계대명곡이 아니라
우주대명곡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낀 뒤에
이 곡을 깊이 사랑하게 됐다.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이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감각은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이다. 시간이 꼬이고, 흘러가고,
되돌아오고, 반복되고, 중첩되며,
한껏 느려졌다가 믿을 수 없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일.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곡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마치 어떤 사건을
한 번은 우리의 맨눈으로, 다른 한 번은
고래의 눈으로, 다른 한 번은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겠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소용돌이에
기꺼이 휩쓸려본다면 정말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음악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통영국제음악제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어떤 음악제보다도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비발디의
음악을 재해석해 또다시 새로운 음향으로
내놓고, 드뷔시의 피아노곡 ‘달빛’과
에펠탑의 정경을 그린 애니메이션을
한자리에서 경험케 한다.
1920년대 무성영화와 그로부터
한 세기 후에 작곡된 음악을 붙이는 묘한
‘시네콘서트’를 열기도 한다. 이자람의
판소리 공연도, “프로그램 연주 당일
공개”라고 써놓은 재즈 콘서트도,
이 시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브리튼 ‘전쟁 레퀴엠’도 주요 행사 중
하나다. 프로그램을 차근히 보고 있으면
과거와 현재, 또는 전통과 현대가 겹겹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이곳이 꼭 ‘시간의
소용돌이’ 같기도 하다.
음악제를 보고 서울로 돌아올 때면
늘 현대, 또는 동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지를 곰곰이 되짚게 된다.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기대하고 간 것이지만 결국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음악들, 현재의 감각으로
예리하게 갈고 닦아진 음악들이다. 그것은
여전히 한국의 고전이기도 하고, 유럽
전통의 토대가 되는 음악이기도 하고,
‘음악’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할 수 없는
어떤 공연이기도 하다. 통영국제음악제는
하나의 구심점을 제시하는 대신 다채로운
현재의 음악을 한자리에 펼쳐놓는다.
서로 다른 음악이 모여 만든 그 장면은
꽤 소란스럽고, 울퉁불퉁하며, 때론
탐미적일 정도로 아름답다가도 까다롭고
낯설기 그지없다. 그 복잡다단한 음악제의
풍경이 나는 너무도 만족스러운데, 그건
오늘의 음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감각이
이렇게나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다.
글 신예슬 음악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