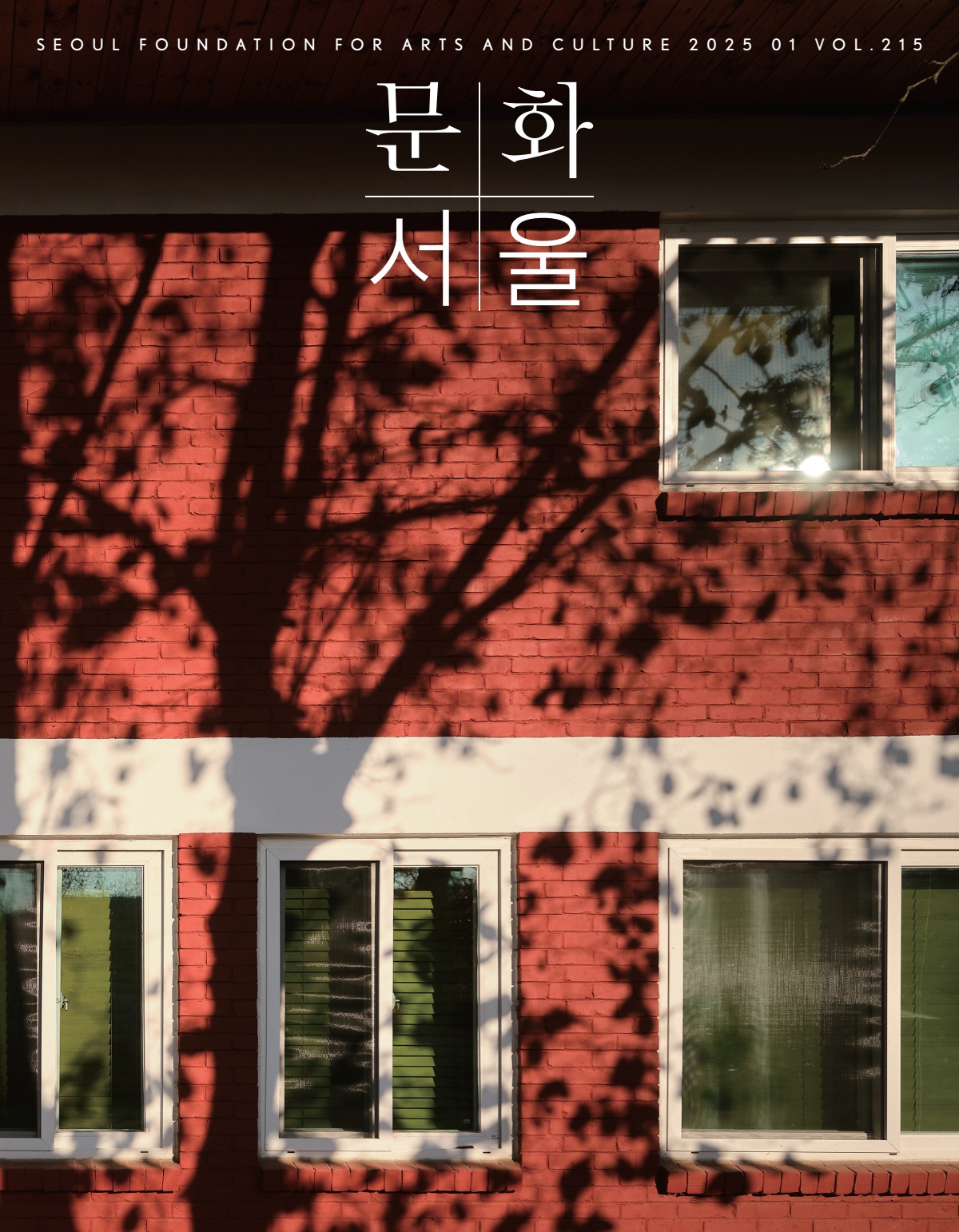나의 진짜 새해소망은
삶의 책장을 넘기며
또다시 한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365일이 온전히 주어졌다고 표현하곤 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순전한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느끼지 못하는 새에 우리에게 따르는 엄청난 행운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새해가 되면 부쩍 죽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잘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보면 결국 ‘웰다잉well-dying’ 즉, 잘 죽는 법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대화가 여전히 터부시되는 우리 문화에서, 모두가 새해 복과 안녕을 빌 때 ‘무슨 말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상시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복은 복대로 빌되 혼자 있을 땐 책을 펼쳐 들었다. 모처럼 눈에 띈 신간 『죽음공부』2024(박광우 저, 흐름출판)다.
이 책은 20년 넘게 신경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로 지내고 있는 저자가 환자 곁에서 목격한 죽음의 다양한 장면을 전하며, 의미 있는 오늘을 위해 우리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한다. 아무래도 저자의 전공이 그렇다보니 응급실처럼 급박한 죽음 앞에서의 사투보다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주어지는 암이나 파킨슨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아주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처음부터 정신을 바로잡고 이별 준비를 단정하게 할 리 없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그래서 대부분은 허둥댄다.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할 행동을 하거나 환자와 보호자가 싸우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말을 건넨다. 나을 수 있으니 힘내라는 기약 없는 말 대신, 남아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끝은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당장 어머님께 잘하셨으면
합니다. 좋아지고 나아질 미래의
어머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면서 쇠약해진 지금의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하고
위로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행을 간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었으면 합니다.
『죽음공부』, 155쪽
전문가의 직언은 허둥대는 보호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나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 있다. 9년 전, 아빠의 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제거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머지는 이제 운명에 맡겨봅시다. 혹시 재발이 있더라도 그때 또 해결하면 돼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딱 그 앞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이 말만큼 힘이 되는 게 없었다. 아주 냉정하지만, 그래서 위안이 됐다. 당사자든 보호자든 후회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으니까. 이런 의사의 조언을 듣고도 환자와 보호자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이든 당시의 최선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죽음의 모습과 사연이 다양하듯 그 앞에서의 자세도 정답이랄 건 없으니까.
저자는 이러한 직언에 더해 의사로서 따라야 하는 현행 의료법이나 현장 상황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다.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게 된 이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생각, 서울의 ‘빅5’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까닭,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등…. 대학병원 1분 진료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로 그랬다. 3개월 전에 다음 진료 날짜를 잡고, 그 날짜가 되면 아빠는 새벽 기차로 서울에 왔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참 기다려 들어가면 진료는 길어야 3분이었다. 그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든 건 절대 아니지만(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대기실을 보고 있으면 서운함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우리 가족은 의사만 바라보고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 이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고 이따금 상상하곤 했다. 수술도, 진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도 말이다. 책에 쓰인 저자의 생각들은 참 막막했던 과거의 내게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을 만큼 든든해지는 내용이었다.
요즘 들어 30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내 나이가 참 좋은 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몸도 아주 젊고, 조사보다는 경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부모님도 노인으로 불리기엔 장년의 느낌이 조금 더 짙을 때.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되는 시절 말이다. 하지만 본가에 갈 때마다 저번보다 주름이 깊어진 부모님을 마주할 때면 인생에서 나만 잘 챙기면 되는 시절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음을 깨닫고 불현듯 두려워진다. 해를 거듭할수록 죽음과 건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강해진다. 허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시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기에, 정말로 그 시기가 닥치면 무척 허둥댈 것이 분명하기에, 요즘 같은 시절에야말로 죽음에 관해 바짝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공부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다. 당장 써먹을 거 같지는 않아서 느슨하게 읽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양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면 좋겠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려 드는 것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죽음의 순간이 내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닥치거든 그간의 배움이 무색할 정도로 헤매겠지만, 아예 모를 때와는 분명 다를 테다. 끝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끝에 다다르기 위한 앞선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끝을 잠시 이야기했을 뿐인데 살아가는 방식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가고 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기를. 늘 끝을 염두에 두고서 이 여정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디디며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나의 진짜 새해 소망이다.
글 손정승 『아무튼, 드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