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안다는 것은 (돈을 더 벌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것
<사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 지음, 이지수 옮김, 마음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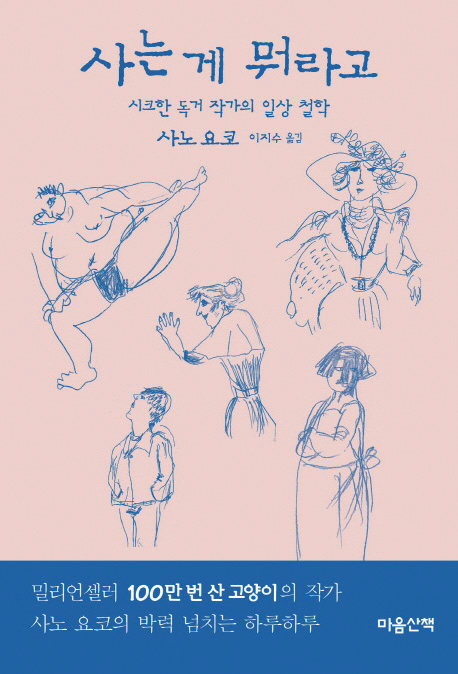
할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짙은 녹색의 재규어를 샀다. 인도된 재규어에 올라타고 ‘아, 나는 이런 남자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이젠 늦었구나’ 한다. 자신에게 재규어가 안 어울린다는 친구 말에는 ‘어째서냐. 내가 빈농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억울하면 너도 사면 되잖아. 빨리 죽으면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는 게 뭐라고>는 일흔에 다가가는 독거 할머니의 솔직한 독백이다.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일본 동화 작가 사노 요코(1938~2010)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뜨기 2년 전까지 쓴 일기 같은 기록을 엮었다.
“나는 나와 가장 먼저 절교하고 싶다. 아아, 이런 게 정신병이다.” 사노는 남에게 못되게 굴고서는 금방 풀이죽어서 자기혐오에 빠지곤 하는 사람이다. “아, 이러다가 친구가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하면 모두들 나를 가리키며 ‘아아, 그 사람’ 하고 비웃을 것 같다.”
역시 고독과 노화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심해지는 건망증을 마주할 때마다 치매를 앓다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겁내고, 섣달그믐에 비디오를 5~6개 빌리려다가도 남의 눈에 불쌍한 할머니로 비칠 게 싫어 포기한다. 좁은 길을 걸을 땐 자신이 여기서 죽어서 쓰러지면 사람들은 자기 시체를 넘어 다녀야겠지, 상상한다.
그러나 유방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게 사노다. “제아무리 애연가라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지. 흥,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가.” 죽음이 정말 무섭지 않냐는 말에는 “오히려 기뻐. 생각해봐. 죽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야. 돈 걱정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행운인걸”이라 응수한다. 남은 날이 2년이라는 선고에 십수 년간 앓던 우울증이 거의 사라질 정도다.
몇 십 년 동안 ‘아 싫다, 가능하면 무엇이든 일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감 직전에야 일을 했고, ‘욘사마’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DVD 사느라 재산을 탕진하지만 그 덕에 불쾌한 항암치료를 견뎌냈고, 전후 시대 어려서 영양실조로 죽은 오빠와 남동생을 잊지 못하는 할머니. 그는 거짓 긍정도 위악도 부리지 않으며 ‘활기차게 살아야 한다’는 둥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는다. 고집쟁이, 주정뱅이, 성깔 더러운 장애인 등 까탈스러운 사노의 곁에 남아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는 이 시원스러운 할머니의 만만치 않은 매력에 빠져들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글이 술술 풀린다면 죽음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 찰스 부카우스키 지음, 로버트 크럼 그림, 설준규 옮김, 모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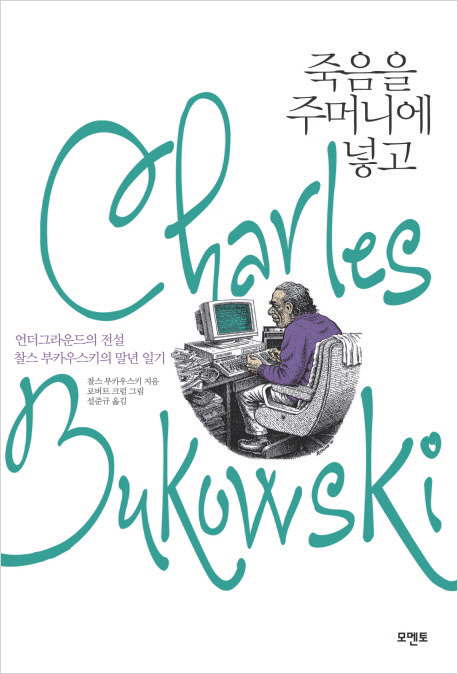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이 모방되는 작가’라는 수식에, 그 당사자인 찰스 부카우스키(1920~1994)는 “뭐, 다 염병할 소리”라고 응수했다.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는 부카우스키가 백혈병으로 죽기 1년 전까지 쓴 일기를 엮은 책이다. 그는 젊은 시절 창고와 공장을 전전하며 하층 노동자로 살았고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다가 49세에 전업 작가가 됐다. “난 괴상하고 거친 한평생을 살았고 삶의 대부분은 끔찍했다. 하지만 난 개똥같은 인생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꾸역꾸역 뚫고 나왔고 그게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다.” 이 같은 그의 이력은 60여 권에 이르는 시와 소설, 산문집에 담겨 있다.
그러나 욕지기가 끊이지 않는 말년의 사적인 일기만큼 부카우스키의 내밀한 생각과 개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글이 있을까. 돈과 인간, 글쓰기, 죽음, 경마, 작가들의 행태에 대한 생각이 주로 일기장을 채우는데, 허위의식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냉소에는 유머와 통찰이 촘촘히 박혀 있다.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는 건 경마장과 도박이다. 지옥 같은 곳, 스스로를 괴롭힐 만한 건수가 널려 있는 경마장에 가지 않으면 부카우스키는 우울해지고 글 쓸 기력마저 없어진다고 고백한다. “어쩐 일인지 난 집에서 나가 거의 모든 인간들이 커다란 쓰레기 더미일 뿐이란 걸 확인하려 든다. (…) 거기 나가 있으면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다. 거기 나가 있으면 내가 너무도 멍청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작가는 자신의 글줄 역시 경마 덕택에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멋있게 들리는 건 내가 도박하듯 글을 쓰기 때문이다.”
부카우스키는 동료 작가들을 ‘한 패거리의 가짜들’이라며 곧잘 비난한다. 또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밝혔다가 항의를 받자 “야, 좆까. 그리고 난 톨스토이도 좋아하지 않아!”라고 자답하는 게 그다.
시와 글쓰기에 대한 부카우스키의 절실한 애착은 감동적이다. 그가 노화를 두려워한 유일한 이유는 ‘글 쓰는 능력이 사라질까봐’였다. 글이 만족스러울 때 그는 “죽음 따윈 엿이나 먹어라”고 적었다. 다음 줄이 풀려나오지 않는다면, 과거도 명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글을 쓸 때면 난 훨훨 날고, 글을 쓸 때면 난 불꽃이 튄다. 글을 쓸 때면 난 죽음을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 벽에 대고 던졌다가 튕겨 나오면 다시 받는다.”
- 글 김여란
- 경향신문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사진 제공 마음산책, 모멘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