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의 시집 <녹턴>과 이순원의 소설 <삿포로의 여인>처럼.

이별이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이가 있다. 결국 헤어지게 될 것을 무엇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투여하느냐는 합리적 계산에서 사랑에 거리를 두려는 이도 있다. 사랑이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되어 있는 ‘임시적’ 사태라는 점에서 그런 태도들은 그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지닌다(연애와 결혼을 거쳐 평생을 해로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들 앞에는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 없는 삶이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에 수반되는 위험과 부담이야말로 삶의 불가피한 일부요 감추어진 본질이 아니겠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이별조차 사랑의 종말이나 배반이 아니라 그 일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곱씹으면서 김선우 시집 <녹턴>과 이순원 소설 <삿포로의 여인>을 겹쳐 읽었다.
지금 이 사랑에만 집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녹턴>, 김선우 지음, 문학과지성사
“내가 만진 시간, 당신// 을 사랑하는 일// 에 정성을 다하는 것// 굳이 말해야 한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 (…) // 그러니 딴 데 보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에만도 인생은 짧아요.”(김선우 ‘게이트리스 게이트’ 부분)
“이 순간이 전부인 게 어때서?/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
지금 이렇게 전부 주고 싶은데/ 내 전부를 주어 당신을 활짝 꽃피우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라면 뭐겠어?”(김선우 ‘om 4:00,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 부분)
김선우 시집 <녹턴>에서는 오마르 하이얌의 메아리가 들린다. 사랑과 술로 대표되는 순간의 쾌락에 집중하라는 옛 페르시아 시인의 가르침을 김선우는 충실히 좇는다. <녹턴>보다 한 달쯤 먼저 나온 산문집 <부상당한 천사에게>에서도 그는 ‘쾌락주의자’를 자처하며 “찰나의 찬란함을 최선을 다해 누릴 것! 집착 없이 사랑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당연한 말이지만, 쾌락주의가
반드시 반사회적?폐쇄적 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김선우의
시집과 산문집을 잠깐만 읽어보아도 그 점은 분명하다). 김선우의 사랑은 치열하면서도 자유로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사랑에 따르는 고통과 피로, 실망과 배신조차 너른 품으로 끌어안는 대승적 사랑이다. 그러할 때 흔히 사랑의 종말과 동일시되는 이별이 사랑의 엄연한 일부로 승화하는 ‘기적’이 발생한다.
“1월이 시작되었으니 12월이 온다”(‘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라고 시인이 쓸 때, 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2월과 3월과 4월과 (…) 10월과 11월이 부질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월과 12월 사이의 그 달들은 그것들대로 살뜰하고 충만한 의미를 지니고서 몸에 깃들고 기억에 새겨진다. 그렇게 충실하게 겪은 사랑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 마침내, 당연하게도, 12월이 올 때 이 연인들이 치르는 사랑 종말의 제의(祭儀)를
지켜보자.
“서로를 위해 기도한 우리는 함께 무덤을 만들고/ 서랍 속의
부스러기들을 마저 털어 봉분을 다졌다./ 사랑의 무덤은 믿을 수
없이 따스하고/ 그 앞에 세운 가시나무 비목에선 금세 뿌리가 돋을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므로 이미 가벼웠다./ 고마워.
안녕히.”(‘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 부분)
차갑고 어두운 이별이 아니라 따뜻하고 생기 도는 이별이다. 이런 연인들에게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1월이 시작되면 12월이 온다”(‘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차라리 축복에 가까운 것이다.
오직 그때만 가능했던 사랑에 대해
<삿포로의 여인>, 이순원 지음, 문예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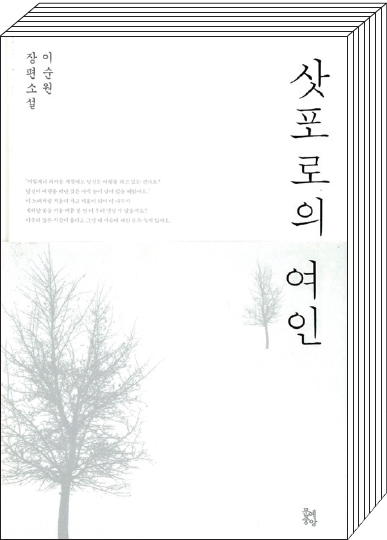
이순원 소설 <삿포로의 여인>은 대관령을 무대로 펼쳐졌던 풋풋한 사랑을 20년 뒤에 새삼 돌이키며 되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20년 전 당시 열일곱 살 소녀와 스물네 살 청년으로 피차곤궁한 시절을 함께했던 연희와 주호가 두 주인공. 어린 연희가
주호 ‘오빠’에게 더 의지했고 그런 연희를 주호가 보살핀 것은 사실이지만, 연희를 향하는 주호의 마음이 그리 단순한 것만도 아니었다. “많은 부분 연희 처지에 대한 연민이었을 테지만, 때로는
마음이 함께 어려져 같은 시기에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어린
연인처럼 여겼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주호는 자신과 연희의 관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런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20년 전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는 회한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다.
가령 주호는 종종 연희를 차에 태우고 대관령에 오르곤 하는데, 고갯마루에서 연희는 일본에 가 있는 엄마를 목 놓아 부르곤 했었다. 그러다가 연희 역시 일본으로 떠나게 되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관령에 함께 오르고 그곳에서 청춘남녀는 피차 생애 최초의 포옹을 하는데, 포옹이 포옹으로 그치고 입맞춤 정도의 ‘진도’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주호는 뒤늦게 후회한다. “열여덟 살의 여자아이를 두 팔로 안고도 끝까지 자기 몸과 마음의
물기에 냉담했던 것, 어쩌면 그거야말로 그 상황에서 당연히 품었음직한 청춘의 음험함보다 나쁜 죄였는지 모른다.”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닿고 재회하기를 기대했던 두 사람이 결국
재회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충분히 사랑하고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소설과 김선우의 시집을
겹쳐 읽으면서 나는 해보았다.
- 글 최재봉
- 한겨레 문화부 선임기자. 1961년 경기 양평 생. 경희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저서 <그 작가 그 공간> <언젠가 그대가 머물 시간들> <거울나라의 작가들> 등.
- 사진 제공 문학과지성사, 한겨레출판, 문예중앙














